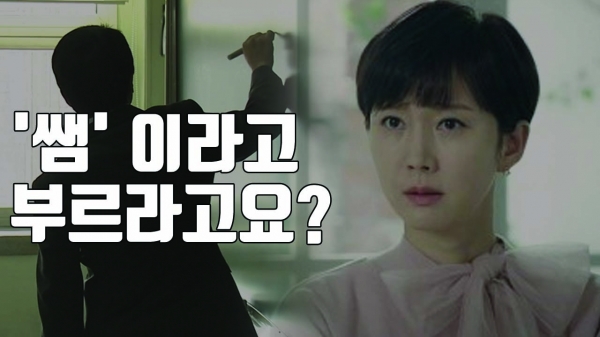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선생님’ 호칭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8일 발표한 '서울교육 조직문화 혁신방안' 가운데 ‘수평적 호칭제’ 도입의 하나로 선생님이라는 호칭 대신에 ‘님’ 또는 '쌤'이나 영어 이름, 별명을 사용하는 방안을 철회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또한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며 제시한 스탠딩회의와 반바지 허용 등 복장자율화, 연가사용 활성화도 적용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5일 내부 회의를 열고 ▲호칭 변경 ▲스탠딩회의 ▲반바지·샌들 출근 ▲연가 사용 활성화 등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을 본청과 교육행정기관으로 제한하고, 학교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이 국외출장에서 돌아오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뒤 최종 방침을 확정, 학교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는 당연한 일이다. 이번 논란의 원인을 두고 대부분은 교육청의 탁상행정을 꼽는다. 그러나 기자는 이는 현상일 뿐 본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논란의 본질은 교육청이 ‘호칭’, ‘복장’, ‘회의형식’, ‘연가사용’ 등 학교문화조차 교육청이, 교육감이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있다.
우리는 헌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자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광역시장과 도지사 외에 교육감을 별도로 두고, 교육감을 주민직선제로 선출하는 것도 교육자치를 위한 것이다. 특히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분리해 교육감에게 국가사무를 위임하는 것도 교육행정의 전문화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행정의 전문화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학교자율성은 교육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학교자치의 실현이 교육자치의 목적이고, 학교자치가 교육자치의 꽃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학교자율은 항상 교문 밖에 머물고 있다. 정권마다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교육청에서 학교로 권한 이양을 외치지만, 자율은 늘 교문을 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호칭을 ‘쌤’으로 통일하자고 한 것처럼 교육감은 시시콜콜한 것까지 간섭한다. 아직도 일선 학교, 선생님들 의견은 무시해도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인식이 교육부나 교육청에 널리 퍼져있다.
실제로 현행 교육자치법을 살펴보면, 교육감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 교육자치법 18조(교육감) 제1항에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고 규정하고, 이어 제20조(관장사무)에는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해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 △예산·결산안의 작성·편성 및 제출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등 17개 항에 관해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감이 마음만 먹으면 관장사무로 명시된 17개 항을 걸어 교육에 관한 절대권한을 휘두를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쌤’ 호칭 논란도 이 같은 흐름과 무관치 않다. 영국의 사상가인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자신이 내린 결정이 가장 바람직한 이유는 그것이 가장 최선이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젠 교육청, 교육감은 권한을 말만이 아닌 제대로 내려놔야 한다. 학교와 선생님들에게 자율권을 돌려줘야 한다. ‘쌤’이던 ‘선생님’이던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