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인뉴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어디일까? 히말라야 정상에 오르는 길일까? 미대륙을 동서로 또는 남북으로 횡단하는 길일까? 아프리카의 세렝게티 대초원을 넘는 길일까? 쿠바의 혁명가 체 게바라가 게릴라 활동을 하면서 넘나들던 남미의 정글 숲길일까? 아니면 남극이나 북극의 극한 지대를 횡단하는 길일까?
수많은 물리적인 길들이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기억을 소환하여 다양한 곳을 내세울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길들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에 비하면 결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무슨 농담이냐고? 아니다.
위에서 말한 물리적인 거리는 어느 정도 힘든 시간이 흐르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한다.
하지만 평생 걸려도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어지는 길에 도달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리고는 임종 시에 “용서하라” 또는 “미안하다”고 고백하며 마침내 불안정하게 여정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상대를 수용(acceptance)하는 여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다.
그런데 요즘은 가슴에서 발까지 내려가는데도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왜냐면 마음의 느낌이나 감정, 결단을 실천하기까지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머리에서 발까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라면 공감할 수 있을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멀고 힘들었다는 산티아고의 순례길도, 세계 최고봉인 12좌를 오르는데 걸린 등정길도, 대한민국 제주도의 전 구간 올레길도 머리에서 발까지의 거리에 비하면 ‘새 발의 피(鳥足之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 진짜 멀기는 먼 길이다.
일찍이 정신의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Alfred Adler)는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만큼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이 ‘관계’라는 데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가정·직장·사회에서 관계 때문에 크고 작은 갈등이 빚어진다. 단지 개인 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조직과 조직, 국가와 국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재난의 시기에 봉쇄, 격리,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엄청난 불편을 겪으면서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그 관계를 위해서는 경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지난 5월의 어느 날 2달간의 봉쇄에 지친 이탈리아인들은 각자의 베란다에 나와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왜 그랬을까? 이러한 행위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혹시라도 자신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나 다시금 점검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시간이었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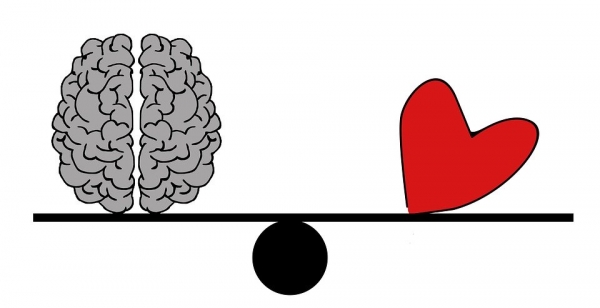
필자는 요즘 지인들의 모임에 가면 빠지지 않고 자식들 걱정에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는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잠시 쉬는 자녀와, 출가할 때 집을 장만해 주려고 융자를 받거나, 심지어 자녀들의 적은 임금에 생활비까지 보조해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온통 자식 걱정이다.
그뿐이랴. 손주가 생겨 그들을 돌보느라 인생 제2막의 자유를 저당 잡혀 살아가는 고충들이 다수다.
물론 말로는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관계에서 나오는 책임감이고 우리 문화의 뿌리 깊은 관념이며 실존에선 자존심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경우다.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도 먼 과거 이야기다.
현실은 인정(人情)과 무한 책임으로 무장한 부모로서의 ‘무조건적 삶’이 지배하여 적절한 선을 지키거나 경계의 벽을 허물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하지만 디행히도 최근엔 또 다른 일각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은 아니라는 인식하에 전통적인 관행을 깨는 용감한 행위를 듣기도 한다.
이제 우리도 21세기 세계적인 표준에 맞는 합리적인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실에서 발생하는 실정을 보다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한국인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보듯이 부모와 교사는 모든 것을 바쳐 자식과 제자를 위해 헌신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라졌다.
가정에선 노년에 남는 것이라곤 가난과 질병, 자식의 무관심과 심지어 학대가 존재한다. 학교에선 모든 교육 활동이 교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저해하는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고 공교육은 신뢰를 상실한 채 교권은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니 교사의 말년이 허무하게 지나기 일쑤고 명퇴를 심각히 고려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뿐이랴. 가정에선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의 그늘에 의존해 살아가는 소위 ‘기생충’, ‘은둔형 외톨이’ 자녀가 껌딱지처럼 달라붙어서 부모의 등골을 휘게 만든다. 또 자식을 출가시켰다 하더라도 평생 토탈 서비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모가 한둘이 아니다.
학교에선 교사도 제2의 부모라 불리며 사정은 마찬가지다.
사도(師道)를 걸어야 한다는 사명감과 의무감이 부여된 교직은 품위 유지와 높은 도덕률이 요구된다. 그 속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을 지키지 못하고 임의로 설정한 경계를 허물지 못해 온갖 굴레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악순환을 하고 있다.
이 세상에 이런 무한 책임을 짊어지는 부모와 교사가 대한민국 이외에 또 어디 있을까? 그렇다면 상호 간의 행복한 관계, 적정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
가족 관계, 사제지간의 관계, 나아가 직장 상하 관계, 국가와 국민의 관계 등 우리는 크고 작은 인간의 조직 속에서 관계를 맺어야 살아갈 수 있다. 혼자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 그러나 그 관계는 합리적이고 보편적이며 공평무사하며 도덕적 관계여야 한다.
어느 한쪽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매사 불공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당연히 그 관계는 서로에게 소중한 인권을 보장하며 윤리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무한정 자식(제자) 사랑에 때로는 윤리의식을 상실한 채 부끄러운 부모(스승)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곤 그것이 관행상 당연하다고 자기합리화를 한다.
예컨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자식을 위해 시험지를 유출하거나 또 고위직이거나 교수란 직위를 이용하여 자식을 위해 불공정한 행위를 청탁하거나 스스로 빈틈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공개된 사실이다.
유흥가를 돌면서 폭력이나 범법 행위를 저지른 자식을 감싸고 이를 돈으로 죗값을 유리하게 조작하는 것도 결국은 부끄럽고 부도덕한 어른의 행태이다. 특히나 부유층, 고위직에서의 이러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아직도 우리의 현실에선 사회적 시선이 관계에 인위적인 경계를 긋곤 한다. 뉴스에서 듣고 보는 험악한 사건·사고들은 우리 일상에 경계라는 높은 벽을 세워놓은 사례다. 그 벽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망치기도 한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다.

적정한 선이 있어 좋은 관계가 유지되기도 한다. 그 선을 넘으면 나쁜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니 제발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은 절대 넘지 말고, 불필요한 벽은 마음으로 넘어섰으면 좋겠다.
결국 세상의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 상사와 부하의 아름다운 관계는 이성에 근거한 솔선수범과 도덕적인 행위에서 나온다. 본능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부끄러워할 줄만 알아도 이는 지극히 당연한 문제다.
그러나 지나친 이기적인 행태나 불공정하고 부정의한 관행을 무의식적으로 답습하는 것을 아직도 당연한 자신들의 특권이라고 여기는 기득권층, 특히 지도층과 부유층의 위험한 사고를 더 이상 우리 사회가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
선을 넘고 벽을 허물지 못하는 관계에서 연유하는 일체의 범법 행위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이를 위해선 어려서부터 철저한 책임감과 도덕적 마인드를 키우는 인성교육으로 우리 사회를 서로가 신뢰하고 함께 살아가는 민주공동체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책무성이자 민주시민 교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