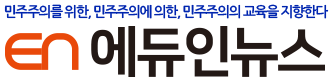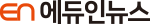“쉬이 지는 붉은 꽃, 낭군의 마음 같고,
끝없이 흐르는 물, 이내 수심 같구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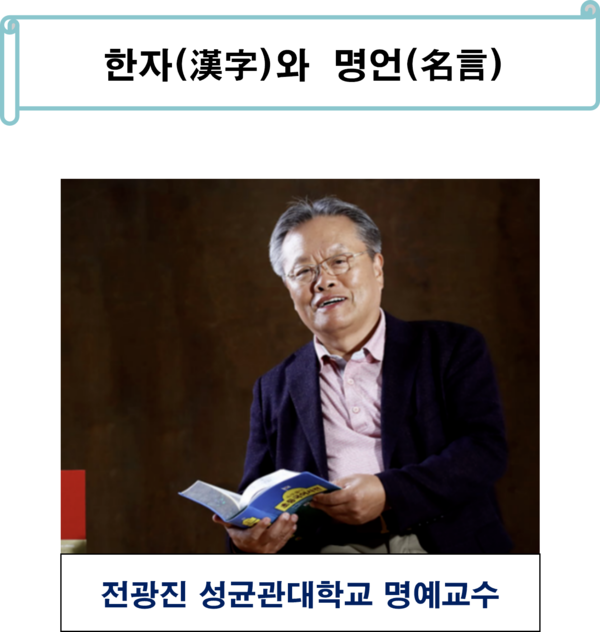
◎ 花 環 (화환)
*꽃 화(艸-8, 7급)
*고리 환(玉-17, 4급)
낭군의 마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 마음을 자기의 수심(愁心)과 대비하여 기가 막히게 표현한 당시(唐詩) 한 구절이 있어 명언 삼아 소개 해 본다. 먼저 ‘1등을 한 선수에게 트로피와 화환이 수여되었다’의 ‘花環’을 뜯어본 다음에! 한자어는 소포 같아서 뜯어봐야 직성이 풀린다.
花자는 한 송이 꽃이 피어있는 모습을 그린 華(화)의 속자였다. 후에 華자는 ‘화려하다’(flowery)는 뜻을 차지하고, 花자는 ‘꽃’(꽃)이란 뜻을 차지하는 分家(분가)가 이루어짐으로써 속자란 굴레를 벗게 됐다. 이 경우의 化(될 화)는 발음요소이니 뜻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環자에는 원래 구슬 옥(玉)변이 없었다. 상의(上衣)의 중간에 매달려 있는 둥근 옥을 바라보는 눈[目]을 그린 것이었다. 둥근 모양의 ‘옥’(ring jade)이 본뜻이며, ‘고리’(ring) ‘사방’(all directions) ‘주위’(surroundings) 등으로도 쓰인다.
花環은 ‘꽃[花]으로 만든 고리[環] 모양의 것’을 이른다. 禍患(화:환)이라 쓰면 ‘뜻밖에 일어난 재앙[禍]과 근심[患]’을 이르니, 영 엉뚱한 말이 된다. 화환(花環)을 받으면 좋으나 화환(禍患)을 당하면 큰일이다. 이러니 한자를 몰라도 될 것인가? 요즘 젊은이들의 문해력 붕괴는 ‘한자어 속뜻인지 능력 지수’(HQ, Hint Quotient)가 낮기 때문이다. 이 칼럼은 HQ를 높이는 것이 주목적이다.
맨 앞에서 예고한 바 있는 당시 한 구절을 우리말로 옮겨 본다. 시인의 관찰력과 표현력에 감탄하는 분들이 많을 듯! 중국 당나라 때 시를 잘 쓰는 호걸이라는 뜻인 ‘시호’(詩豪)란 별명을 얻은 바 있는 유우석(772-842)이 지은 것이다.
“쉬이 지는 붉은 꽃, 낭군의 마음 같고;
끝없이 흐르는 물, 이내 수심 같구려!”
花紅易衰似郞意, 화홍이쇠사랑의
流水無限似儂愁. 유수무한사농수
- 劉禹錫.
*儂: 나 농.
◎ 전광진, 성균관대 명예교수 /
<우리말 속뜻 논어> 국역인
(jeonkj@skku.edu).
[에듀인뉴스(EduinNews) = 인터넷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