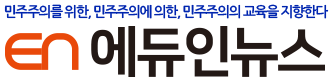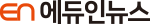“일생에 몇 번이나 통쾌히 웃을런가,
술독을 마주하면 대취해 쓰러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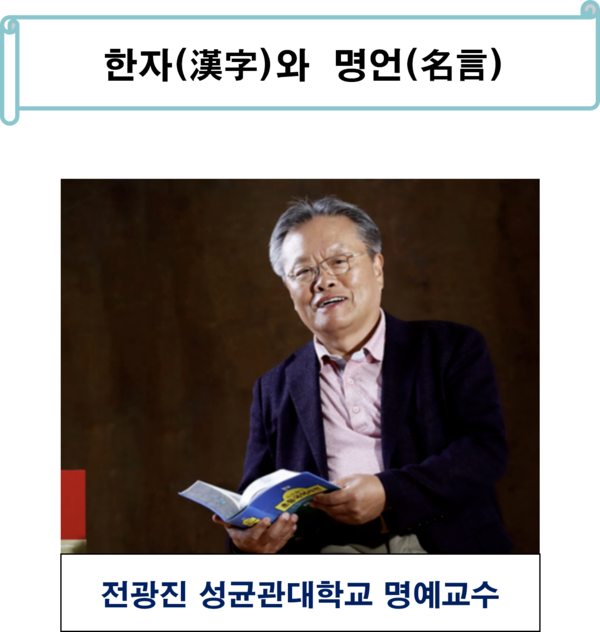
◎ 痛 快 (통쾌)
*아플 통(疒-12, 4급)
*기쁠 쾌(心-7, 5급)
통쾌(痛快)하게 웃으려고 통음(痛飮)했다간 영원히 못 웃을 수도 있다. 오늘은 ‘痛快’란 단어를 푹푹 삶아 완전히 익힌 다음에 이에 관한 명언을 찾아본다.
痛자는 ‘아프다’(painful)가 본뜻이니 ‘병들어 누울 역’(疒)이 의미요소다. 甬(길 용)이 발음요소였음은 桶(통 통)도 마찬가지다. ‘몹시’(greatly)란 뜻으로도 쓰인다.
快자는 ‘기쁘다’(joyful; delightful)는 뜻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 ‘마음 심’(心=忄)이 의미요소로 쓰였고, 夬(터놓을 쾌)는 발음요소다. ‘상쾌하다’(fresh) ‘건강하다’(healthy) ‘빠르다’(quick; fast) 등으로 확대 사용됐다.
痛快(통:쾌)는 ‘아플[痛] 정도로 기분이 상쾌함[快]’, ‘마음이 매우 시원함’을 이른다.
당나라 시인 잠삼(715-770)이 지은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다. 술을 마시고 통쾌하게 웃는 것까지는 좋다. 그러나 폭음과 통음은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건강을 잃으면 만사가 끝장이다. 영원히 못 웃을 수도!
“일생에 몇 번이나 통쾌히 웃을런가,
술독을 마주하면 대취해 쓰러지리!”
一生大笑能幾回, 일생대소능기회
斗酒相逢須醉倒. 두주상봉수취도
- 岑參.
◎ 전광진, 성균관대 명예교수 /
<우리말 속뜻 논어> 국역인
(jeonkj@skku.edu).
[에듀인뉴스(EduinNews) = 인터넷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