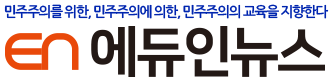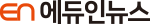이런 것도 미술이라면 그 이유는 뭔가?
지난시간 주제가 ‘자연과 교감하는 미술’이었지요. 대표적으로 대지미술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눈에 익어 덜 하지만, 40여 년 전 이러한 미술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꽤 충격적 사건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것도 미술인가?”하고 말이지요.
요즘은 이보다 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 발표하는 미술가들이 많습니다. 미술은 본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인데, 전혀 아름답지 않은 무언가를 ‘미술’의 이름으로 당당히 전시합니다. 심지어는 썩어가는 동물사체를 내걸기도 하지요. (아래사진. 천년 A Thousand Years 1990, 데미안 허스트)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일단은 미술교과서에 나오는 흔한 방식으로 먼저 변명을 잠시 해보겠습니다.
1. 흔한 변명의 근거 : 미술은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예술이지만, 시대와 지역에 따라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과 기준이 다르다.
2. 변명의 전개 : 어떤 대상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듯이 미술작품도 그러하다. 미술에서 아름다움은 ‘예쁘다’거나 ‘진짜와 똑같다’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죽음이나 추함도 아름다움의 영역에 포함된다. 미술의 생명은 독창성과 새로움이므로 작품의 기준이나 조건도 시대에 따라 늘 새롭게 변화한다.
어떤가요? 얼핏 교과서에 나와도 될 만큼 정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는군요. 두 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과 기준은 도대체 누가 정하는가?”
“나한테 전혀 아름답지 않아도 (아름다움의) 새로운 기준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되나?”
이 문제는 미술세계에서 오랫동안 물어온 질문이며,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어느 시대나 자신의 시대가 최첨단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숙명처럼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오늘날 미술은, 20세기에 벌어진 두 차례 세계대전과 19세기에 발명된 사진기를 비롯한 기술발달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시간흐름에 따라 아름다움의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면 도움이 되겠지요? 이쪽은 주로 ‘미술사(史)’가 다루는 분야입니다.
다음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철학이야기를 잠시 할까요. 아, 안심하셔도 됩니다. 말만 들어도 잠부터 쏟아지는, 그런 철학은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지난시간에 잠깐 언급했지요? 출발선입니다. ‘나는 누구인가?’하는.
그림을 감상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도 알고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 질문을 끝없이, 스스로한테 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기왕 할 거면 좀 더 분명하게 하자는 것이지요. ‘나는 누구인가’하는 이 의문(출발선)은 유사 이래 철학이 가장 잘 다루어 왔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계속)